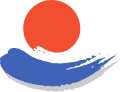강릉시

| 강릉시 | |||||
|---|---|---|---|---|---|
 강릉시청 전경 | |||||
| |||||
 강릉시의 위치 | |||||
| 행정 | |||||
| 국가 | 대한민국 | ||||
| 행정 구역 | 1읍, 7면, 13동 | ||||
| 일반구 | 0구 | ||||
| 법정동 | 38동 | ||||
| 청사 소재지 | 강릉대로 33 (홍제동) | ||||
| 단체장 | 김홍규(국민의힘) | ||||
| 국회의원 | 권성동(국민의힘, 강릉시) | ||||
| 지리 | |||||
| 면적 | 1,040.04km2 | ||||
| 인문 | |||||
| 인구 | 211,381명 (2023년) | ||||
| 세대 | 103,352세대 (2023년) | ||||
| 인구 밀도 | 203명/㎢ | ||||
| 상징 | |||||
| 나무 | 소나무 | ||||
| 꽃 | 배롱나무 | ||||
| 새 | 고니 | ||||
| 지역 부호 | |||||
| 웹사이트 | 강릉시 | ||||
강릉시(江陵市)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중부에 있는 시이다. 서울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영동 지방 최대 도시이다. 서쪽으로 태백산맥이 뻗어 있고, 동쪽으로 동해가 펼쳐져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73.72km이다. 겨울에는 한랭한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오면서 푄현상을 일으켜 같은 위도의 서해안보다는 기후가 온난하고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에 가깝다. 연안은 수심이 깊고 계절에 따라 한류와 난류가 흘러 어종이 풍부하다. 경포대와 오죽헌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강동면에는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기차역인 정동진역이 있다. 해마다 음력 5월에는 세계무형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열린다. 고등 교육기관으로는 국립 대학교인 강릉원주대학교와 사립 대학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공립 대학교인 강원도립대학교 등이 있다. 시청은 홍제동에 있고, 행정구역은 1읍 7면 13동이다.
역사
[편집]본래 동예이자 남말갈, 예국(濊國)의 땅으로 하슬라(河瑟羅)라고 불렸다. 일대가 비옥해 살기 좋았다고 한다.
고구려는 이곳을 하서량(河西良) 또는 하슬라(河瑟羅)라 부르고 예국을 속국으로 삼아 이곳을 지배했다.
639년 신라가 이곳을 점령하고 (신라 선덕여왕 8년) 소경(小京)으로 삼아 북빈경(北濱京)이라 하여 사신(仕臣)을 두었다. 658년(신라 태종 무열왕 5년) 무열왕이 "이곳은 말갈과 인접해 있다"라는 이유로 소경을 폐지하고 아슬라주를 만들어 도독을 파견하였으며 757년(경덕왕 16년) 명주(溟州)로 개칭하였다가 776년(혜공왕 12년)에 복구하였다.
고려 태조 때 명주라 다시 개칭되고, 성종 14년(995) 삭방도(朔方道)의 행정 중심지로 함남북과 영동 일대와 영서의 춘천 이북 등지를 관할하였다. 1178년 이를 폐하고 함남과 강원 영동 일대를 임해(臨海) 명주라 개칭하고 원종 4년(1263) 강릉도라 고쳤으며, 그 후 다시 함남 쌍성(雙城) 지방과 합하여 강릉삭방도라 하였다. 공양왕 때 함경도를 분리하고 강릉도라 다시 칭하였으며 항시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로 되어 왔다. 조선 초에는 원양도(原襄道)·원춘도(原春道)라 칭하다가 세종 5년(1423) 강원도라 하였다. 1895년 23부제 실시로 강원도가 춘천부와 강릉부로 나뉘며 영동의 군들을 관할했다가, 이듬해(1896년) 강원도가 재설치되면서 강릉군만 관할하게 되었다.
연표
[편집]-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
- 13면 - 군내면, 덕방면, 성남면, 자가곡면, 정동면, 사천면, 상구정면, 하구정면, 성산면, 연곡면, 신리면, 옥계면, 망상면
- 1916년 10월 1일: 군내면을 강릉면으로, 자가곡면을 강동면으로 개칭하였다.
- 1917년 11월 1일: 상구정면을 왕산면으로, 하구정면을 구정면으로 개칭하였다.
- 1920년 11월 1일: 성남면, 덕방면을 성덕면으로 합면하고, 성남면에서 나뉜 일부를 정동면에 편입 (12면)
- 1931년 4월 1일: 강릉면을 강릉읍으로 승격하였다.[2] (1읍 11면)
- 1937년 4월 1일: 신리면을 주문진면으로 개칭하였다.
- 1938년 9월 1일: 정동면을 경포면으로 개칭하였다.
- 1940년 11월 1일: 주문진면을 주문진읍으로 승격하였다.[3] (2읍 10면)
- 1942년 10월 1일: 망상면을 묵호읍으로 승격하였다.[4] (3읍 9면)
- 대한민국
- 1945년 9월 16일: 38선 이남의 양양군을 강릉군에 편입하였다. (3읍 12면)
- 1954년: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시행에 따라 현북면과 서면을 양양군에 편입하였다. (3읍 10면)
- 1955년 9월 1일: 강릉읍, 성덕면, 경포면 등을 합쳐 강릉시로 승격하고, 강릉군을 명주군으로 개칭하였다.[5] (2읍 8면)
- 1963년 1월 1일: 현남면이 현 양양군에 편입 (2읍 7면)
- 1965년 4월: 옥포동을 옥천동과 포남동으로, 입암동을 두산동으로 분동하였다.
- 1973년 7월 1일: 왕산면 남곡리, 구절리가 정선군 북면으로 편입됨[6]
- 1980년 4월 1일: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합쳐 동해시로 승격 (1읍 7면)
- 1983년 2월 15일: 구정면 언별리가 강동면으로 편입되었고, 구정면 산북리가 성산면으로 편입되었다.[7]
- 1983년 10월 1일: 남문동과 성남동을 중앙동으로 합동하고, 교동을 교1동과 교2동으로 분동하였다.
- 1995년 1월 1일: 강릉시 일원과 명주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복합형태의 강릉시가 설치되었다.[8]
- 1995년 3월 2일: 포남동을 포남1동과 포남2동으로 분동하였다.
- 1998년 10월 1일: 중앙동과 임당동을 중앙동으로, 장현·노암·월호평동을 강남동으로, 입암동과 두산동을 성덕동으로, 유천·죽헌·운정·저동을 통합하여 경포동이라 한다.
- 2001년 12월 17일: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로 이전 개청
- 2006년 10월 4일: 강릉시 월호평동 일부를 학동으로 편입함
- 2007년 12월 26일: 강릉시 금학동의 일부와 임당동의 일부를 옥천동으로 편입함
- 2009년 1월 4일: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일부(영동대학)을 홍제동으로 편입함
- 2009년 12월 23일: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일부를 대전동으로 편입하는 대신에 강릉시 대전동 일부를 사천면 방동리로 편입함.
- 2011년 7월 29일: 시청사 도로명 주소 부여, 강릉대로 33(홍제동)
- 2014년 1월 8일: 유천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3개의 법정동 행정구역(유천동, 홍제동, 교동)을 2개의 법정동(유천동, 홍제동) 구역으로 관할 경계 조정함.
- 2017년 9월 13일: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를 산대월1리, 산대월2리로 나눔.
- 2018년 6월 27일: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1리, 산대월2리를 산대월리, 순포리로 명칭변경.
- 2022년 2월 3일: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를 여찬1리, 여찬2리로 나눔.
지리
[편집]
영동 해안의 중앙에 위치하며 배후에 태백산맥의 오대산(五臺山, 1563m)·황병산(黃柄山, 1,407m)·대관령(大關嶺, 832m) 등을 지고 전면에 동해를 바라보는 남대천 좌안에 발달하였다. 부근 일대는 남대천이 퇴적한 동해안 유수의 대평야이며 산자수명한 곳으로 전체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강릉시엔 경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포호라는 호수 하나가 존재한다.[9]
동쪽은 동해에 접해 있고, 서쪽은 평창군, 남쪽은 동해시, 북쪽은 양양군에 접해 있다.
위치
[편집]한반도의 허리인 태백산맥 동쪽 중앙에 위치해 있다. 동쪽은 동해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홍천군 내면, 평창군 진부면 및 대관령면과 각각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동해시, 정선군 임계면과 맞닿아 있으며 북면에 북쪽으로는 양양군 현북면과 현남면과 닿아 있는 등 강원도내 5개 시, 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10]
강릉시의 해안선은 64.5km로 강원도 해안선 318km 중 20.2%를 점유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오대산, 대관령, 석병산 등 1,000m이상의 높은 태백산맥과 접하고 있으며 서에서 동으로 3개의 산맥이 뻗어 있으며 그 중앙에 남대천이 흐른다.[10]
면적
[편집]강릉시 총 면적은 지난 1995년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으로 1,040.4km2로 강원도 16,875km2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1km2당 207명(2019년말 기준)이며 강원도 평균 인구밀도 91.4명 보다 2.3배 정도 높으며, 강원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속초시(786.8명), 동해시(528명), 원주시(372.3명), 춘천시(245.8)에 이어 5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릉시는 전체면적 중 임야가 80.5%(837.36km2), 논이 4.9%(51.17km2)로 구성되어 있어 산지를 제외한 이용가능 지역은 상당히 적어 도시성장의 제약이 되고 있다.[11]
기후
[편집]| 강릉의 기후 도표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65 5 -3 | 59 6 -2 | 72 11 2 | 78 18 8 | 84 23 13 | 122 25 17 | 197 28 21 | 288 28 21 | 207 25 16 | 104 20 11 | 82 14 5 | 44 8 -1 |
| 기온 단위: 섭씨(℃) 강수량 단위: 밀리미터(mm) 출처: [12] | |||||||||||
강릉은 온난 습윤 기후(쾨펜의 기후 구분 Cfa)에 속한다. 또한 강릉은 동쪽으로 동해와 접해 있어 해양성 기후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도에 비하여 겨울철은 온난하고 여름철은 비교적 시원한 편이어서 연교차가 작은 편에 속한다. 연 평균 기온은 13.5°C, 1월 평균 기온은 0.9°C, 8월 평균 기온은 25.0°C이고, 연 평균 강수량은 1444.9mm이다. 특히 겨울철에 서해안보다 온난한 원인으로 북서계절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발생하는 푄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13]
강수량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여름에 적고, 봄·가을·겨울에 많은 것이 특징이며 영서 지방보다 많은 편이다. 간혹 북동기류의 장시간 유입시 겨울철은 대설, 여름철은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1956년 적설량은 120cm 이상을 기록하여 인명피해를 내고 교통 통신이 일시 마비된 일도 있다.
겨울과 봄철에는 강풍과 함께 건조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 강릉시 (강릉기상관측소, 용강동)의 기후 | |||||||||||||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연간 |
| 역대 최고 기온 °C (°F) | 18.7 (65.7) | 21.4 (70.5) | 27.1 (80.8) | 33.6 (92.5) | 35.5 (95.9) | 37.0 (98.6) | 39.4 (102.9) | 38.9 (102.0) | 35.8 (96.4) | 32.8 (91.0) | 29.1 (84.4) | 21.8 (71.2) | 39.4 (102.9) |
| 일평균 최고 기온 °C (°F) | 5.3 (41.5) | 7.1 (44.8) | 11.7 (53.1) | 17.9 (64.2) | 22.7 (72.9) | 25.4 (77.7) | 28.1 (82.6) | 28.6 (83.5) | 24.6 (76.3) | 20.3 (68.5) | 14.0 (57.2) | 7.7 (45.9) | 17.8 (64.0) |
| 일일 평균 기온 °C (°F) | 0.9 (33.6) | 2.7 (36.9) | 7.0 (44.6) | 13.1 (55.6) | 17.9 (64.2) | 21.3 (70.3) | 24.7 (76.5) | 25.0 (77.0) | 20.5 (68.9) | 15.6 (60.1) | 9.5 (49.1) | 3.3 (37.9) | 13.5 (56.3) |
| 일평균 최저 기온 °C (°F) | −2.7 (27.1) | −1.3 (29.7) | 2.6 (36.7) | 8.2 (46.8) | 13.3 (55.9) | 17.5 (63.5) | 21.6 (70.9) | 21.9 (71.4) | 17.0 (62.6) | 11.5 (52.7) | 5.6 (42.1) | −0.5 (31.1) | 9.6 (49.3) |
| 역대 최저 기온 °C (°F) | −20.2 (−4.4) | −15.9 (3.4) | −11.7 (10.9) | −3.5 (25.7) | −0.8 (30.6) | 6.0 (42.8) | 11.3 (52.3) | 13.7 (56.7) | 6.3 (43.3) | −1.9 (28.6) | −9.3 (15.3) | −15.3 (4.5) | −20.2 (−4.4) |
| 평균 강수량 mm (인치) | 47.9 (1.89) | 48.0 (1.89) | 65.1 (2.56) | 81.9 (3.22) | 79.2 (3.12) | 118.5 (4.67) | 250.2 (9.85) | 292.9 (11.53) | 229.3 (9.03) | 113.9 (4.48) | 81.1 (3.19) | 36.9 (1.45) | 1,444.9 (56.89) |
| 평균 강수일수 (≥ 0.1 mm) | 6.2 | 5.7 | 8.8 | 8.9 | 9.1 | 10.8 | 16.0 | 16.4 | 11.8 | 7.8 | 7.3 | 4.6 | 113.4 |
| 평균 상대 습도 (%) | 46.8 | 49.2 | 52.8 | 52.2 | 59.3 | 69.3 | 74.7 | 76.4 | 73.0 | 61.5 | 52.7 | 45.6 | 59.5 |
| 평균 월간 일조시간 | 190.2 | 182.2 | 199.3 | 209.6 | 218.7 | 176.9 | 148.9 | 151.3 | 162.1 | 192.5 | 175.2 | 189.7 | 2,196.6 |
| 출처: 기상청 (평년값: 1991년~2020년, 극값: 1911년~현재)[14][15] | |||||||||||||
보통 강릉 지역은 내륙지방이나 서해지방보다 겨울철에 온도가 더 높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안지방은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더 높다. 바다의 온도가 육지의 온도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서해지방보다 겨울철에 온도가 더 높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태백산맥이 시베리아의 북서계절풍을 막아주어서 차가운 바람이 차단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동해의 수온이 서해의 수온보다 더욱 따뜻하기 때문이다.
임야와 산림
[편집]홍천군, 평창군, 강릉시 경계 지역에 오대산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다. 강릉시 면적의 80.4%가 임야이다.[11]
강과 하천
[편집]강릉시의 모든 하천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다. 강릉시를 유역으로 하는 하천으로는 연곡천, 사천, 남대천, 섬석천, 경포천, 군선강, 시동천, 주수천, 정동천, 낙풍천이 있다.
지질
[편집]
강릉 지역은 옥천대의 북동부인 경기 지괴와의 경계부에 위치하며, 분포하는 지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강릉 북부 지역의 중생대 화강암 지역과 강릉 남부 강릉탄전 지역의 고생대 퇴적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선캄브리아기의 암석은 북서쪽 끝 지역에만 조금 분포한다.[16][17]
안인리에서 묵호동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와, 대관령 동방 4 km 지역에서부터 강릉 남방 12 km 지점인 만덕봉 부근에까지 이르는 지역은, 석탄(무연탄)이 산출되어 소위 강릉탄전(江陵炭田)으로 불리는 지역이다.[18] 강릉탄전 지역에 분포하는 고생대 퇴적암은 하부로부터 고생대 초 오르도비스기의 석병산층, 고생대 말 석탄기의 만항층, 금천층과 페름기의 장성층, 함백산층, 망덕산층, 언별리층으로 구성된다. 이중 석병산층은 조선 누층군에, 나머지는 평안 누층군에 해당한다.[16] 강동면 심곡리의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을 따라 평안 누층군의 노두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 지층명 | 구성 암석 | 두께 (m) |
|---|---|---|
| 언별리층 | 담녹회색/백색 사암, 담녹색 셰일 | 250 |
| 망덕산층 | 암회색 사암, 셰일 | 250 |
| 함백산층 | 유백색/(담)회색/담녹색의 (극)조립사암, 담녹색-(녹)회색 세립사암, 흑색/암회색 셰일, 사암 | 200 |
| 장성층 | (암)회색 중-조립사암, 암회색/흑색사암, 무연탄 | 150 |
| 금천층 | 암회색 사암, 흑색 세립질사암, 사질셰일, 셰일, 석회암 | 80~120 |
| 만항층 | 저색/녹색/회색 셰일, 녹회색 세립/조립사암, (녹)회색 셰일, 실트스톤, 석회암 | 300 |
해안단구는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서부터 정동진을 거쳐 심곡리까지 해안에 접하여 잘 발달한다. 여러 층준의 해안단구가 인식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가장 전형적이고 규모가 큰 것은 정동진 이남에 분포하는 것들이다. 특히 강동면 심곡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는 정동진 해안단구는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동진 해안단구는 해발고도 75 m에서 85 m 사이에 위치하며, 대략 4 km의 길이와 1 km의 폭을 보인다. 정동진 지역의 해안단구층은 분급이 좋지 않고 원마도가 높은 사력들로 주로 구성되며, 정동진 해안단구의 북단에서 상부 평안 누층군과 단구층과의 경계를 볼 수 있다. 상부 평안누층군은 정동진 해안단구층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을 따라서 수직의 단구애를 형성하고 있다. 단구애를 형성하고 있는 상부 평안 누층군은 북동방향의 주향과 북서쪽으로 약 30° 경사하는 매우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동진의 해안단구면은 5개의 단구면이 나타나며,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의 간빙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동진 해안단구층의 형성시기는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로 알려져 있다.[16]